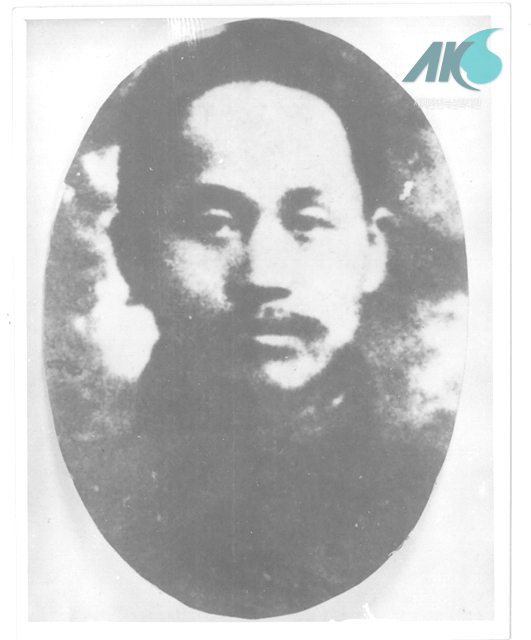재만 한인 문학
| 한자 | 在滿 韓人 文學 |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일제 강점기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인 작가들의 문학.
일제 강점기 한인의 만주 이주와 개척 과정을 그린 문학으로 ‘만주 이민 문학’, ‘재만한국문학’, ‘간도문학’이라고도 한다. 일제 강점기 시기 몰락한 많은 조선 농민들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지만 만주 지역에서 그들의 삶은 척박한 환경에 원주민과의 갈등, 일제의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로 계속되는 고난의 삶이었다. 이주 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주에 정착함으로써 오늘날의 한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주와 개척의 역사를 그린 문학이 바로 일제 강점기의 재만 한인 문학이다.
재만 한인 문학은 다양한 작품에서 유랑과 이주, 개척과 정착, 저항과 연대 등의 의미와 양상을 표현한다. 소설가로는 최서해, 강경애를 필두로 안수길, 김창걸, 현경준, 박계주 등이, 시인은 김조규, 김달진, 백석, 이육사, 유치환, 윤동주, 이찬, 심연수 등이 이주 한인의 삶을 구체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재현한다. 특히 한국 문학의 문학적 성취가 주춤했던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시기에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재만 한인 작가들의 활동이 한국 문학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 전체가 전하지는 않지만 현경준의 장편소설 『선구시대』를 비롯해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 그리고 『싹트는 대지』, 안수길 작품집 『북원』 등이 재만 한인 문학에서 이주와 개척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김달진, 김조규, 박팔양, 유치환, 함경수 등 18명의 시인이 창작한 90여 편의 시를 수록한『재만조선시인집』과 『만주시인집』을 비롯해 1940년대 만주에서 발간된 수필집 『만주조선문예선』에서도 국가와 민족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수난의 삶을 견뎌냈던 만주 지역 한인의 삶과 정서를 살펴볼 수 있다.
재만 한인 문학은 재만 한인이 조선에서 이주해 왔고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조상들의 경험과 지식을 내면화해 온 존재라는 점, 동시에 만주 지역이 자신들의 노동과 육체가 일상적으로 운용되는 곳이며,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적 습관이 가시적으로 축적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독립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그리고 개척과 정주의 역사가 함께 하는 민족의 장소를 기억하고 현재화하면서 ‘만주’라는 특수한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면서 ‘친밀한 생활 공간’으로 재장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재만 한인 문학은 민족 문학의 중요한 현장이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연속성이 시작되는 출발선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 구재진 외, 『해외 한인문학 창작현황 자료집 3-중국 조선족문학』(한국문학번역원, 2020)
- 김장선, 『만주 문학 연구』(역락, 2009)
- 김호웅, 『재만 한인 문학 연구』(국학자료원, 1998)
- 오양호, 『만주 이민 문학 연구』(문예 출판사, 2004)
-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 소설 연구』(한국문화사, 2004)
-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김형규, 「만주, 민족의 기억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토포스」(『디아스포라 웹진 너머』6호, 한국문학번역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