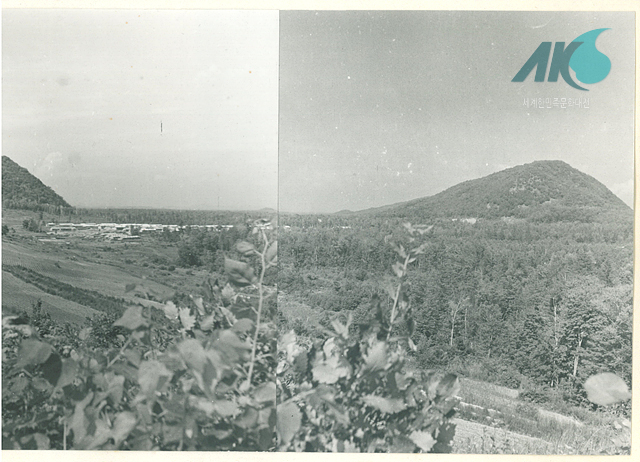내두산 보위전
| 한자 | 內頭山 保衛戰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사건 |
|---|---|
| 관련인물/단체 | 왕덕태|항일 유격대 제2군 |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32년 |
| 종결 시기/일시 | 1936년 1월 |
| 발단 시기/일시 | 1935년 9월 |
| 전개 시기/일시 | 1935년 11월 |
| 전개 시기/일시 | 1935년 겨울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31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33년까지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32년부터 1935년까지 |
| 발생|시작 장소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
| 종결 장소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
1935년 겨울에 내두산 유격 근거지에서 일제의 토벌대 800여 명의 공격을 방어하며 큰 전과를 올린 전투.
북간도 지역에서 중공 하부 조직의 확대와 발전으로 9·18 사변 이후 화룡현 평강 유격대, 연길현 노투구 유격대, 왕청현 라자구 유격대, 훈춘현 대황구 별동대 등이 조직되어 있었다. 1931년 2월 발표된 ‘동만 유격대 대강(東滿遊擊隊大綱)’에는 이러한 유격대의 성격, 임무, 지휘 계통, 전술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런 무장 단체들은 1931년 9·18사변 이후 항일 유격대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933년 초까지 10여 개가 창설되었다. 대표적인 항일 유격대로는 1932년에 설립된 연길현 항일 유격 대대[대대장-박동근(朴東根), 정위-박길(朴吉)], 1933년 11월에 설립된 왕청현 항일 유격대[대대장-양성용(梁成龍), 정위-김명균(金明均)]· 훈춘 유격대[1933년 3월 훈춘현 유격 총대로 발전, 총대장-공헌침(孔憲琛), 총정위-박태익] 등이다.
이들 유격대의 근거지는 연길현 의란구 왕우구, 팔도구 석인구, 노투구 위자구(葦子溝), 옹성라즈구 삼도만 부근의 능지영(能芝營), 왕청현 2구의 소왕청·마촌, 왕청현 5구의 삼도구[가야하], 사수평(泗水坪)과 영창동, 훈춘현 황구(荒區)의 대황구, 훈춘현 영통라즈구의 연통라즈, 화룡현 평강구의 어랑촌, 삼도구의 우복동(牛腹洞) 등이다.
이러한 항일 유격대의 발전과 유격 근거지의 창설은 일제에게 큰 위협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하여 3차례의 대대적인 군사 토벌을 감행하였다.
제1차 토벌은 1932년 봄부터 1933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1932년 4월 3일, 일제는 조선 나남 제19 사단으로 구성한 간도 파견대, 4월 17일 일본 관동군 平賀 부대, 쯔루미[鶴見] 부대를 동만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우선 훈춘, 연길, 화룡, 왕청 등 현의 유격 근거지를 공격하고, 해당 지역민들을 학살하였다. 제2차 토벌은 1933년 11월 하순부터 1934년 봄까지 진행되었다. 일본군과 위만군은 세 갈래로 나누어 동만 각 근거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1934년에도 항일 유격대가 1,253명으로 발전하자 일제는 1934년 가을부터 동만 유격 근거지에 대하여 제3차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 토벌에서 일제는 1934년 3월말에 결성된 동북 인민 혁명군 제2군을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일제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주요 도시와 큰 마을, 교통 요지 등을 지키게 하고, 정예 부대를 주요 지역으로 파견하여 항일 유격지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1935년 8월 30일 일본 관동군 사령부는 ‘소화 10년 관동군 추기 치안 숙정 만주국 방면 협력 요망’을 제정하고, 이 ‘숙청 계획’에 따라 장춘·열하 일대에서 대량의 군대를 이동하여 3개월 내에 반일 무장 세력을 철저히 소멸하고자 하였다.
1935년 9월 중순 항일 세력에 대한 대토벌이 시작되자 동북 인민 혁명군은 이를 분쇄하기 위해 제2군 제1단·제2단을 소분대로 편성하고, 안도·돈화·몽강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쳐 나갔다.
1935년 10월 토벌군은 처창즈의 유격 근거지를 포위 공격하기로 하고, 오동양차·송강·쓰치개 방면으로부터 공격해 왔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2군의 군장 왕덕태는 직사포· 박격포 등의 중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며칠 동안 접전하였다. 하지만 제2군은 병력의 열세 속에서 근거지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력 부대를 내두산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서남차로 이동하였다.
서남차에서 두달 정도 머물러 있던 제2군은 ‘유격전으로 넘아 가라’는 동만 특위와 군부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처창즈에 있던 제2군 군부와 일부 부대는 1935년 11월에 유격 근거지를 해산하고, 병기 공장·옷 공장·병원 등의 후방 기관들은 모두 내두산으로 옮겨갔다.
내두산 근거지는 마을을 중심으로 송강과 천지에 이르는 주위 100여 ㎞ 구간이 무인지경이었다. 1935년 겨울 일본군은 안도현의 이선도 ‘토벌대’와 현 소재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박격포 부대· 위만 경찰· 위만군 등 800여 명 병력을 동원하여 내두산을 공격하였다.
이때 제2군의 주력은 적후에서 유격 활동을 하고 있어, 근거지 내에는 2개의 병력들 뿐이었다. 첫째날 전투에서 군장인 왕덕태는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연속해서 공격해 오는 적들을 격퇴시켰다. 이날 전투에서 일본군 10명이 전사하였다.
이튿날 적들은 내두산을 3면으로 포위하며 공격을 다시 감행하였다. 왕덕태는 좌우 부대에게 적들의 공격을 막게 하고, 1개 부대를 인솔하여 정면에서 적들과 항전하여 후퇴시켰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아군의 병력이 부족해졌고, 아동단· 여전사· 부상병까지 전투에 투입되었다. 또한 주민들도 밥이나 물, 탄약까지 전선으로 날라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왕덕태는 지리를 이용한 소분대 습격전으로 전술을 변경하였고, 적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사기도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왕덕태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명령하고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소분대를 빠르게 이동시켜 적들을 앞뒤로 포위하였다. 결국 적들은 산 아래로 후퇴하였고, 추운 날씨로 인해 토벌을 지속할 수 없었다.
제2군은 이 전투에서 300여 명의 적을 소멸하고,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이후 왕덕태의 주력 부대는 영안으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토벌대는 1936년 1월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다시 내두산을 공격하였다. 내두산 유격 근거지의 군민들은 두 차례 적의 공격을 물리쳤으나,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 근거지를 포기하고 무송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항일 유격 근거지를 토벌하던 일제에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유격 전술로 근거지를 지켜내고 큰 전과를 올린 전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손춘일,「간도 조선인 친일 단체 間島協助會 에 관한 연구」(『한국 문화속의 외국 문화』,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2002)
- 이명근 외,『연변 조선족사』상 (연변인민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