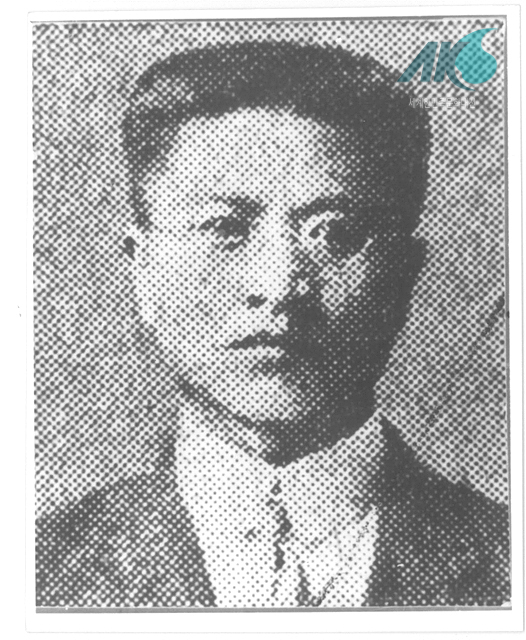손정도
| 한자 | 孫貞道 |
|---|---|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 성격 | 독립운동가, 선교사 |
|---|---|
| 성별 | 남자 |
| 대표경력 | 개신교 목사|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흥사단|한국노병회 노공부장|대한 야소교 진정회 회장|농민호조사 |
| 출생 시기/일시 | 1881년 7월 26일 |
| 수학 시기/일시 | 1903년 |
| 수학 시기/일시 | 1907년 |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4월 |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4월 |
| 활동 시기/일시 | 1920년 1월 |
| 활동 시기/일시 | 1922년 2월 23일 |
| 활동 시기/일시 | 1922년 8월 |
| 활동 시기/일시 | 1923년 |
| 활동 시기/일시 | 1927년 |
| 몰년 시기/일시 | 1931년 2월 19일 |
| 추모 시기/일시 | 1962년 |
| 특기사항 시기/일시 | 1912년-1914년 |
| 특기사항 시기/일시 | 1919년 |
| 출생지 | 평안남도 강서군 |
| 학교|수학지 | 평양 |
| 활동지 | 상해 |
| 활동지 | 상해 |
| 활동지 | 상해 |
| 활동지 | 상해 |
| 묘소 |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활동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손정도의 호는 해석이며,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의 부친이다. 1882년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이다. 본래 평양숭실 전문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으나, 어느 날 하디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감동을 받고, 국가가 가져야 하는 자주 독립과 국민이 가져야 할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손정도는 1919년 국내에서 3·1 운동 시위계획에 참여하였다가 중국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의장을 맡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근거지를 세우고 독립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흥사단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한국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힘을 쏟는 등 동포들을 애국심으로 뭉치게 하여 자주독립을 앞당기고자 하였다.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10년에 선교사로 중국동삼성에 파견되었을 때 독립운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1912년 하얼빈에서 조선 총독 가쓰라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전라남도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1914년에 석방되었다.
1919년 국내에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중국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그 해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제1회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회의가 김신부로(金神父路) 22호 회의장에서 개최되었을 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국무총리에 이승만(李承晩) 등을 선임하였으며, 이시영이 초안한 10개 조의 헌장(憲章)과 정강(政綱)을 심의, 통과시켜 4월 13일 임시정부가 내외에 선포되었다. 4월 13일 이동녕의 후임으로 임시 의정원 의장에 당선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소집된 국민대회에서는 박은식·신채호 등과 함께 한성정부의 평정관(評定官)에도 선출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국내에서 모금된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10월 15일에는 박은식과 함께 상해에서 대한 교육회를 조직하여 독립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자 하였다.
1920년 1월에는 김구·김철(金澈) 등 10여 명과 같이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의용단(義勇團)을 조직,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다. 1921년 3월 3일에는 대한 야소교 진정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국내외 각지의 교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조해 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1922년 2월 23일 대한적십자회 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되어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였다. 동년 8월에는 김구(金九) 등 동지들과 함께 한국 노병회(勞兵會)를 조직하고 노공부장(勞工部長)에 뽑혀 노농병 양성과 군비 조달에 힘쓰는 등 독립운동을 측면 지원하였다.
1923년에 접어들면서 임시정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의 알력이 심해짐에 따라 국민대표회의가 상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그는 이탁(李鐸)과 함께 평안남도 대표로 참석하여 동년 2월에 재정위원에 선임되었으며, 홍진(洪震)·이시영(李始榮)과 함께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만주 길림(吉林)으로 돌아가 기독교회(基督敎會)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워 선교 활동에 전념하였다. 1926년 3월 1일에는 이곳에서 양기탁(梁起鐸)왕삼덕(王三德)·최일(崔日)·박기백(朴起白) 등 동지들과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의 독립문제와 실력양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1927년에는 만주지방 교민의 복지를 위하여 농민 호조사(農民互助社)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30년 12월 고활신(高豁信)·오인화(吳仁華) 등의 초청으로 길림에서 민족운동문제를 협의하다가, 1931년 2월 19일 동양의원에서 병사하였다.
동작동 국립 묘지 임정요인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 김후경·신재홍, 『대한민국 독립운동 공훈사』(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 『독립운동사』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 『독립운동사자료집』 7·8·9·10·11·1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1974·1983)
-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 정부사(大韓民國 臨時 政府史)』(집문당, 1982)
- 『대한민국 독립유공 인물록』(국가보훈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