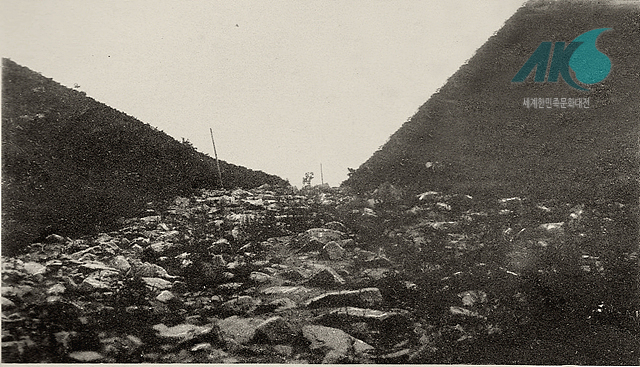「오랑캐령」
| 한자 | 오랑캐嶺 |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성격 | 설화 |
|---|---|
| 주요등장인물 | 오랑개|농부|소도둑|수달이 변한 총각|처녀 |
| 모티프유형 | 쓸쓸히 세상을 떠난 오랑개|수달의 아들을 낳은 처녀 |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1990년 2월 |
| 수록|간행 시기/일시 | 2010년 |
| 관련 지명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용정시(龍井市)에서 ‘오랑캐령’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설화.
「오랑캐령」은 두만강 상류에 소재한 ‘오랑캐령’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명 전설(地名傳說)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성이 오씨이고, 이름이 랑개라는 사람이 살았다. 소도둑을 잡아달라고 부탁한 농부가 오랑개가 도둑을 잡는 점은 못 친다고 소문을 냈다. 그는 후손도 없이 수도를 하다가 저세상으로 갔고, 그의 시신을 묻은 곳을 ‘오랑캐령’이라 불렀다. 또 두만강 기슭에 살고 있는 처녀가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물을 마시고 임신하였다. 어느 날 수달이 총각으로 변해 찾아와 아이의 아버지가 본인이라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오낭(五囊)을 씌워서 다녔다. 그래서 ‘오랑캐령’이라 부른다고 한다.
성이 오씨이고, 이름이 랑개라는 사람이 홀로 살았다. 오랑개는 글공부를 했기에 복술에 쓰는 주문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환자의 병을 봐주고 나오는 길에 농부가 소를 훔친 도둑을 잡기 위해 점을 쳐달라고 하였다. 농부를 따라가서 보니, 소를 훔쳐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다. 오랑개는 소를 사람이 아닌 호랑이가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농부는 이를 믿지 않고, 오랑개가 도둑을 잡는 점은 못 친다고 소문을 냈다. 오랑개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동정해서 도와주곤 하였다. 그는 후손도 없이 수도를 하다가 저세상으로 갔고, 청탁하러 간 사람이 그의 시신을 묻어 주어 그곳을 ‘오랑캐재’, ‘오랑캐령’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두만강 기슭에 살고 있는 한 처녀가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목이 말라 늪에서 물을 마셨다. 그랬더니, 처녀는 물에 취해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부모들이 와서 흔들어 깨워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녀는 임신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저녁, 농부의 집에는 멋진 총각이 한 명 찾아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늪 속에 사는 수달이며, 밤에는 사람으로 변해서 산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물을 먹는 처녀가 마음에 들어 임신하게 했다고 하였다. 처녀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였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버지를 닮아 몸에서 비린내가 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다섯 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달아 주었다. 그래서 수달 부자에게 오낭(五囊)을 씌워서 넘어 다니던 고개라 하여 ‘오랑캐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랑캐령」의 주요 모티프는 각 편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오랑개’이며, 두 번째 편의 모티프는 ‘수달의 아들을 낳은 처녀’이다. 첫 번째 편에서는 한 사람의 무덤이 있기에 고개 이름이 생겼다고 했고, 두 번째 편에서는 이물(異物)과의 혼인부터 고개 이름과 연계된다. 자의로 일시적으로 변신하는 변신담의 경우, 비범한 후손의 출생과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지만, 「오랑캐령」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없고, 오히려 주인공이 인간 세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
- 『한국 민속 문학 사전』-설화편(국립 민속 박물관, 2012)
- 한정춘, 『압록강 유역 전설집』(연변인민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