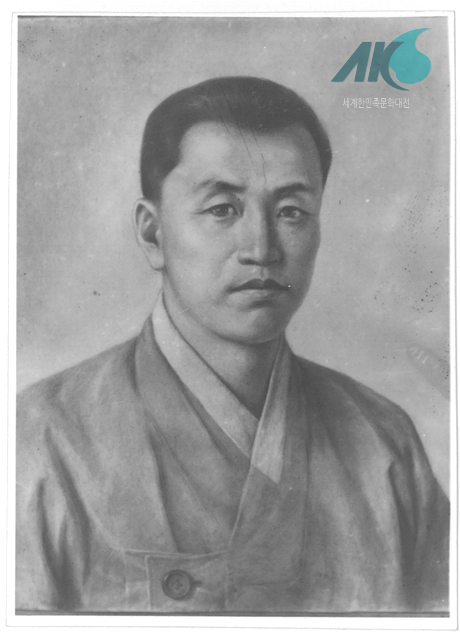조선 혁명군
| 한자 | 朝鮮 革命軍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요령성 무순시 신빈만족자치현 왕청문진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항일 무장 단체 |
|---|---|
| 설립자 | 국민부 |
| 설립 시기/일시 | 1929년 5월 |
| 해체 시기/일시 | 1938년 9월 6일 |
1929년 5월 길림시 우마행호동(牛馬行胡洞)에서 조직된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 부대.
조선 혁명군은 1929년 4월 참의부(參議府), 정의부(正義府), 신민부(新民府)가 국민부(國民府)로 통합되면서 정의부 소속 독립군 6개 단위 부대를 개편하고 참의부, 신민부의 일부 병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부대로 재편하였다. 초기 규모는 300명 정도로 추측되며, 남만주 거의 전 지역을 작전 구역으로 삼았다.
1932년 9월 국민부가 자치 행정만 전담키로 하면서 조선 혁명군은 조선 혁명당 소속의 부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1932년 12월 20일 조선 혁명당 결의에 따라 조직 내용과 편제를 크게 개편하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총사령에 이진탁(李辰卓), 부사령에 양세봉(梁世奉), 참모장에 이웅(李雄)을 선출하였고 종전의 10개 부대가 7개 중대로 재편되었다. 또한 담당 구역에서 길림·액목·오상 등의 북방 구역이 제외되면서 동만주 지방을 추가하였다.
1930년 8월 조선 혁명군을 다시 5개 중대로 개편하였다. 제1중대장 김보안(金輔安, 保安), 제2중대장 양세봉, 제3중대장 이윤환(李允煥), 제4중대장 김문거, 제5중대장 이종락(李鍾洛) 등이 임명되었다. 같은 시기에 조선 혁명군 내부에서 노선 투쟁과 이념 대립이 크게 발생하여 좌우파가 대립하였는데 결국 좌파 세력이 축출되면서 지휘부 일부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1930년 10월 조선 혁명당 군사 위원장 현익철(玄益哲)이 조선 혁명군 총사령을 겸임하고 조직을 정비하였다.
1931년 8월 31일 심양에서 현익철이 일경에게 체포된 이후 김보안(金輔安)이 총사령직을 승계하였다. 1932년 12월 19일 신빈 사건(新賓事件)으로 총사령 김보안 및 조선 혁명당과 국민부 주요 간부 다수가 체포되었다.
1932년 초 양세봉이 새로이 총사령직에 선출되고 참모장에 김학규(金學奎)가 임명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1932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중국 의용군과 연계하여 대일 항전에 나섰다. 이후 1933년 기존 근거지인 신빈현 왕청문으로 사령부를 옮기고 전 병력을 5개 부대로 개편하였다. 1934년에는 부대를 3개 사령부 7개 중대 체제로 개편하여 무장 투쟁을 강화하였으나 일제의 탄압 공작 강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1934년 9월 20일 양세봉이 피살되면서 조선 혁명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참모장이었던 김호석(金浩石)이 총사령으로 추대되었다. 1934년 11월 11일 국민부와 조선 혁명군을 통합하여 고이허(高而虛)를 총령으로 하는 조선 혁명군정부(朝鮮革命軍政府)로 재편하였다. 이후 1935년 9월 대한 제국 무관 출신 김동산을 총사령으로 선출하고 조선 혁명군의 편제를 3개 사로 재편하였으며, 왕봉각(王鳳閣)과 중한 항일 동맹회(中韓抗日同盟會)를 결성하여 공동 항일 전선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1937년 3월 말 왕봉각 부대가 붕괴되면서 조선 혁명군정부도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일제의 토벌 작전으로 지속적으로 쇠퇴하였고, 마지막 조선 혁명군 사령관 김활석(金活石)이 1938년 9월 6일 만주국안동 공서(安東公署)에 체포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멸하였다. 그러나 중국관내로 합류한 일부 인사들은 이후로도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1931년 9월 만주 사변 이전까지 조선 혁명군은 주로 선민부(鮮民府) 등 일제 협력 기관 및 친일파 처단, 국민부 의무금 징수 및 군자금 모집, 독립군 모병, 반공 활동 등에 집중하였다.
1932년 4월 양세봉은 중국 의용군과 합세하여 신빈현 영릉가(永陵家)를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80여 명의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섬멸했다. 이후 일·만 연합군의 반격에 한 차례 철수하였으나 곧 이춘윤(李春潤) 부대 등과 공동으로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1932년 5월 8일에는 일·만 연합군이 영릉가를 대규모로 공격하자, 조선 혁명군은 이춘윤 및 왕동헌(王彤軒) 부대와 연합하여 이를 방어하였다. 또한 신개령(新開嶺) 전투에서 적 200여 명을 살상하는 등 5월 중 6차례의 전투에서 적에게 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조선 혁명군은 병력 보충을 위해 통화현 강전자에 속성 군관 학교를 설치하여 400여 명의 장교와 사병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넓은 지역에서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1932년 7월에는 조선 혁명군 단독으로 쾌대무자(快大茂子)에서 만주국군 30여 명을 사살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양세봉은 우수한 대원을 밀파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군자금 모집, 일제 기관 습격, 친일파 처벌 등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1934년 이후 조선 혁명군은 주로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35년 9월의 쾌대무자 전투에서는 매복 기습으로 적 8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혁명군은 적은 예산으로 빈곤자 및 전상 대원(戰傷隊員), 또는 그 유족들의 구제에 활용함으로써 활빈 사업이나 사회 복지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 혁명군은 만주 지방에서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며 활약한 최후의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이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랜 동안 조직을 유지하며 일제와 항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조선 혁명군은 한·중 연합 작전을 통해 적지 않은 적군을 살상하고 만주 및 식민지 한국의 통치를 교란하여 강대한 일본 군경과 만주국 관헌 등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1931년 9월 만주 사변 이후 크게 증강된 일본군의 대부대를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점에서 무장 독립 투쟁 역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
- 장세윤,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51-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 무장 투쟁』(독립 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 한국학 중앙 연구원 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한국학 중앙 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