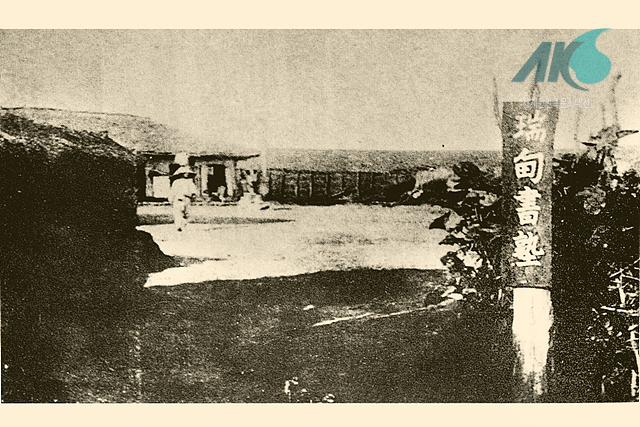한인 근대 교육의 산실, 서전 서숙과 그 뒤를 이은 민족 학교들
| 한자 | 韓人 近代 敎育의 産室, 瑞甸書塾과 그 뒤를 이은 民族 學校들 |
|---|---|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교육/교육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모름지기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 없이는 인재가 날 수 없고, 인재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평온한 때에도 그렇지만,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더더욱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이를 통한 입국(立國)을 중시한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이다.
1910년을 전후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정든 고향 땅을 멀리하고 한반도를 떠나 간도와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통해 미국하와이 등지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이들 가운데 특히 간도와 극동 지역에 정착한 한민족들은 자신은 굶주려도 자녀의 교육만큼은 반드시 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임시 거주가 아닌 상시 거주를 위해 둥지를 옮겼던 만큼,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고는 후손들이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 많은 조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동북 지역에 정착을 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자식은 공부 시킨다’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1905년 을사 늑약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정치적 망명자, 지식인 항일 인사들이 대거 간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가속화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변 지역의 첫 조선인 서당은 1887년 두만강 북안의 자동(紫洞)[현재의 자동(子洞))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후 1901년 김약연(金躍淵)[1868~1942]의 규암재 서당이 장재촌에 세워지면서 조선인 사회의 교육 입국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선인 근대 교육의 초석을 세운 인물은 이상설(李相卨)[1870~1917]이라고 할 수 있다. 1906년 4월, 이상설은 이동녕(李東寧)[1869~1940]과 함께 일제의 눈을 피해 인천항에서 상해행 배에 몸을 실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해삼위(海蔘威)]를 거쳐 그해 8월 용정에 도착했다. 이상설은 유학과 신학문을 접했던 인물로, 영어·일어에도 능숙한 근대적 지식인이었다. 또한 투철한 민족 의식의 소유자였는데, 그의 민족 의식은 서전 서숙(瑞甸書塾)의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05년 이후 신학문이 흥기하고 애국 계몽 운동의 영향이 거세지면서 조선인 집단 거주지 내의 구식 서당 교육은 점차 근대 교육으로 전향되어 갔다. 교사는 대부분 애국주의 성향의 조선인 지식인들이었다. 그 선봉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서전서숙이었다.
서전 서숙은 지금의 용정시 문화로 91번지에 있는 용정 실험 소학교 자리에 있었다. 지금도 용정 실험 소학교의 교정 한켠에는 서전 서숙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족히 100살은 되어 보이는 큰 나무가 그때의 사실들을 대변해 주듯 당당히 자태를 뽐내고 서있다.
100여 년 전 간도 조선인 사회에 근대적인 민족 교육의 길을 열어 놓은 이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 이상설이었다. 이상설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며 광무 황제[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조약 파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각 대신들을 찾아다니며 조약 체결은 곧 ‘망국’으로 이어지고 민족이 ‘왜적의 노예’가 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1905년 11월 30일 민영환의 자결 순국 소식을 듣고 종로 네거리로 나가 모여든 시민들에게 국권 회복 운동에 참여할 것을 연설한 뒤 땅에 뒹굴며 머리를 부딪쳐 자결을 시도했다가 시민들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상설은 이회영·이동녕 등과 상의 끝에 1906년 4월 국외 망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연해주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상설은 다시 구국 인재 양성의 꿈을 안고 인한들이 많이 거주하는 간도 지역으로 건너갔다. 1906년 8월, 이상설은 이동녕·여조현(呂祖鉉)·정순만(鄭淳萬)·박무림(朴茂林)·김우용(金禹鏞)·황달영(黃達永) 등과 논의하고 사재를 털어 용정촌 기독교 인사 최병익(崔秉翼)의 집을 구입해 개조한 후 서전 서숙을 세웠다. 서숙의 운영 경비 또한 이상설 개인의 재산으로 조달하였다. 숙장은 이상설이 맡았고, 교원은 여조현·김우용·황달영이, 운영은 정순만·이동녕이 맡았다.
문을 연 첫 해, 서전 서숙은 각지에서 온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서전 서숙은 간도 조선인 사회에서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인 민족 교육 기관으로, 신학문(역사·지리·산술·정치학·법학 등)을 바탕으로 중·소학교 교육을 망라하는 근대적인 교육과 강도 높은 항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해 나갔다. 이상설은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민족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방문하여 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입학을 권유하는 등 민족 교육에 열정을 기울였다.
그러나 1907년 5월, 이상설이 네덜란드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참가하라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헤이그로 떠난 뒤, 서전 서숙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
이후 이상설의 뒤를 이어 여조현이 숙장으로 추대되어 김우용·황달영 등과 힘을 합쳐 서숙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해 8월 23일 용정에 통감부(統監府) 간도 파출소가 설립되면서 조선인 사회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郞] 소장이 이끄는 통감부 간도 파출소의 감시와 방해로 서전 서숙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교되고 말았다.
일제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교육 입국을 향한 불타는 향학열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전서숙의 교직원들은 일부 학생들과 함께 혼춘 탑도구(塔道溝) 부근으로 옮긴 후 서숙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교원들은 학생을 추가 모집하여 1년 간 수업을 더 지속하였고, 3개 반 학생 74명을 졸업시킨 후 자진 해산했다.
서전서숙이 폐교된 뒤 연변 각지에서는 조선인 사립 학교들이 연이어 세워지기 시작했고, 민족 문화 계몽 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서전서숙의 폐교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전서숙에 이어 연길 교외의 와룡동에 창동서숙(1908), 명동촌에 명동서숙(1908), 자동에 정동서숙(1908), 그리고 국자가 동쪽의 소영자(小營子)에 길동학당(1911) 등이 근대적인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도처에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비록 서숙을 칭했지만, 규모·운영방식·학과목 운영방침 등 모든 면에서 근대 지향적인 교육 체계를 도입했고, 서숙의 명칭도 이후 학교로 개칭하거나 중학부를 설치하는 등 민족 교육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여기서 주목할 학교 중의 하나가 바로 명동서숙이다. 서전 서숙 출신의 김학연(金學淵)은 많은 인사들의 협력 하에 1908년 4월 27일 화룡현 달라자[달라즈·대랍자(大拉子), 지금의 용정시 지신향] 명동촌에 명동 서숙을 설립했다. 이때 서전 서숙 창립자의 한 사람이었던 박무림이 명예 숙장이 되고, 김학연의 사촌형 김약연이 숙감으로 활동했다. 그 후 명동 서숙이 발전하여 1910년 경 3년제 중학부를 둔 학교로 발전했을 때 김약연이 숙장을 맡아보며 명동학교를 근대 교육의 중심 학교로 입지를 다져놓았다.
서전 서숙은 짧은 기간 운영되었으나 구식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의 이행기에 가교 역할을 했고, 나아가 간도 지역 항일 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는 민족 교육의 산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7년에 일제는 용정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두었고, 명동촌 주변인 종성(鍾城) 대안(對岸)의 하천평·호천가, 회령 대안인 우적동·조양천 등지에 헌병 분견소를 설치했다. 나아가 1909년 9월 간도 협정 이후에는 용정·투도구·혼춘 등지에 영사관과 분관을 설치하고 조선인 사회를 통제해 나갔다. 이에 민족 교육에 큰 뜻을 품고 있던 김학연과 김약연은 서전 서숙이 지녔던 의지를 이어 1908년 명동촌에 명동 서숙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근대 교육의 시대를 열어 나갔다.
명동서숙의 숙감으로 재직하던 김약연은 1909년에 신민회(新民會) 일원인 정재면(鄭載冕) 권유로 기독교 학과를 신설하고, 명동 서숙을 명동학교로 개칭했다. 나아가 박태현·장지연 등 우수 교원의 충원을 통해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민족 교육을 추구해 나갔다. 당시 명동촌과 명동학교는 연변 각지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북만주에서도 유학생을 파견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다. 명동학교는 만주·조선·러시아 등지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과 애국 지사들이 모여드는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으며 민족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아 나갔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의 근대적인 민족 교육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방해 공작을 펼쳤다. 1908년 7월에는 용정에 통감부 함경북도 도립 간도 중앙 학교를 세우고 무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인 학생들을 회유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던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들을 ‘망나니’로 치부했다. 결국 교원이 17명이나 되는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54명에 불과했다.
이후 일제는 1910년에 이 학교를 지방의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일본 총영사관에 귀속시켜 관할해 나갔고, 졸업생들의 취직 문제를 보장한다는 후한 조건을 내걸고 78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노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인의 민족 교육 열기를 꺾고자 했다. 그럼에도 간도 항일 지식인들은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이동춘(李同春)·김립(金立)[1880~1922] 등이 교육 입국·국권 회복을 위해 간도 간민회를 조직했고, 이동춘은 천평에 양정숙을 세웠다. 그 후 창동·광성·명동·정동과 같은 4개의 소학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1911년 10월에는 윤화수(尹和洙) 등이 용정에 영신 학교를 세웠다.
한편 이동춘·김립 등은 간도 간민회에 교육부를 설치하고, 간도 지역의 조선인에게 각 호(戶)당 30전씩되는 돈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계봉우(桂奉瑀)[1880~1956] 등의 학자들로 하여금 조선어문·조선 역사·동국지리 등의 민족 교재를 편찬하도록 하여 사립 민족 학교들에 제공함으로써 민족 교육을 크게 고무시켰다.
뿐만 아니라 1914년부터는 영국·독일 등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중소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1914년 6월에는 영국 기독교 선교사 바커(A.H. Barker)[박걸(朴傑); ‘박걸부’, ‘바클’, ‘베이커’, ‘빠카’로도 부름]에 의해 용정에 명신 여학교가 세워졌고, 1917년 7월에는 캐나다 장로파 교회 선교사 스코트(William Scott)[1886~1979]와 푸트(W.R. Foote)[부두일(富斗一); ‘부트’, ‘포드’로도 부름]가 은진중학을 세웠다. 이후 1920년대 들어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 설립은 계속 되었다.
1919년 3월, 간도 조선인 사회에서 벌어진 항일 만세 운동은 조선인 사회나 일본 모두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만세 시위 운동으로 명동촌과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 민족 교육은 위기를 맞기도 했다.
40여 년 간 조선인 사회의 역사와 전통 문화 관련 사진을 촬영해 온 사진 작가이자 용정 3·13 기념사업회 회장 이광평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명동학교와 정동 학교 학생들의 항일 열기가 가장 뜨거웠고, 이들은 선봉에 서서 시위대를 주도하는 등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자. 1919년 초 조선에서 3·1 운동 준비 사업에 참여했던 강봉우(姜鳳우)·김규찬(金奎燦)은 연변에 돌아와 조선의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그 해 2월 서울에서 상품 속에 넣어 보낸 ‘독립 선언서’가 용정의 어느 상점을 통해 명동학교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명동학교에서는 즉시 독립 선언서를 등사하여 간도 각지에 보냈다. 이렇게 준비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3월 12일 아침, 화룡현 덕신사와 지신사 등 각지에서 온 수 천 명의 조선인들이 명동학교에 집결했다. 이때 명동학교는 정동 학교와 연계하여 300여 명의 충렬대를 조직했고, 시위대는 이들을 앞세워 용정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1919년 2월 김약연을 중심으로 파견되었던 간도 대표단은 연해주니콜스크-우수리스크(Nikolsk-Ussurisk)[현재 우수리스크]에서 대한 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발표할 독립 선언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서울에서 3월 1일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이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이 시위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위대가 용정에 도착했을 때에는 평강 방면에서 온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용드레 거리에서 일본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두 시위대는 합류하여 경찰들의 방어를 뚫고 대회장으로 진입했다. 연길·의란구·동불사·명월구·동성용·허문리·화첨자·위자구(葦子溝)·장안·석현 등지에서 이른 시위대도 합류해 대회장은 2만여 명의 시위대로 가득 찼다.
김영학(金永學)에 의해 대회장에서 독립 선언서가 선포되었고, 이후 시위대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 총영사관 방면으로 향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지금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사주를 받고 있던 중국 측 맹부덕(孟富德)의 부하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서 수십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시위 과정과 발포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이 있다. 조선인과 한족들의 설득을 받은 맹부덕의 부하들은 발포를 하지 않았고, 맹부덕의 부하들이 시위대의 설득으로 헛총질을 하자 사복을 입은 일본 총영사관 측 경찰들이 주변의 학생과 군중들에게 발포를 했다는 것이다(허춘림, 한족, 80세/남병규, 조선인, 80세).
시위 과정에서 일제의 무자비한 발포로 수십 명의 군중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14명이었고 부상자가 48명에 달했으며 체포된 이가 98명이었다. 부상자들은 주로 영국더기에 있던 제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로도 5명이 더 사망했다. 용정시 외곽에는 지금도 1차 희생자 14명을 모시는 3·13 반일 의사릉이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간도 국민회 건립 이후 명동촌은 남부 총회의 본부로 사용되었고, 명동학교는 총본부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총회에서는 『독립 신문』·『우리들의 편지』를 발간하여 민중들의 반일 사상을 고취했다.
일제는 명동촌과 명동학교를 ‘불령 선인(不逞鮮人)의 소굴’로 간주하고 탄압의 기회를 노렸다. '불령선인'이란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들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듬해인 1920년 9, 10월에 일제는 조작된 혼춘 사건을 빌미로 간도 출병을 단행했고, 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연변을 포함, 조선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10월 15일부터 명동촌에서 14명을 체포하고, 명동학교와 남부 지방 총회장 마진(馬晋)[1867~1930]의 집을 불태웠다.
토벌대는 명동촌의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학교 마당에 몰아넣은 뒤 항일 운동가들을 내어 놓으라고 위협했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급기야 명동학교를 불태워버렸다. 이와 같이 일제는 항일 사상과 향학 열기의 고조를 막고자 방화와 학살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탄압이 조선인 사회의 향학열을 막지는 못했다.
1920~1930년대 간도의 조선인 사회에서 항일 운동의 중심지는 용정과 명동촌 및 그 주변지역이었다. 이 시기 중반까지 용정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사회의 민족 교육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1909년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될 당시의 용정 인구는 1,500명(290호)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꾸준한 인구 증대로 인해 1920년대 초 용정의 인구는 9,000여 명(1,800호)으로 늘었다. 이어 1932년에는 14,972명(3,170호), 그리고 해방 전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1934년에는 26,035명이 거주했다.
1910년대 명동학교와 창동 학원·정동 중학·길동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민족 교육은 1920년대 들어 초등 교육에서 중학 교육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었다.
이 시기 조선인 사회의 민족 교육은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중국의 신문화 운동의 영향 아래 민중 단체와 종교 단체들에 의해서 추진되어 졌다. 1920년 6월에 영국 전도부인 게투루드 챠스가 명신여자중학을, 그리고 8월에는 토성포 예수교회에서 일광학교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중학 교육을 감당할 많은 학교 기관들을 세워졌다. 크고 작은 많은 학교들 가운데 용정의 대표적인 중학교들로는 동흥중학·대성중학·영신중학·은진중학·명신여자중학, 그리고 광명학원 산하의 학교들(고등 여학교와 사범부·어학원)을 들 수 있다. 이 학교들은 조선인 유지나 지식인, 외국(캐나다) 선교사들, 그리고 일제에 의해 세워졌다. 이 학교들은 새롭게 혹은 기존의 학교를 모태로 재조직되었다.
동흥중학은 천도교인이자 간도국민회 사법 부장직을 역임했었던 최익룡(崔翼龍)에 의해 건립되었다. 항일 인사였던 최익룡은 김홍선·이주화(李周和)·한장순 등과 손을 잡고 각지 천도교인의 후원을 받아 1921년 4월 15일에 천도교 종리원 명의로동흥 소학교를 창립하고 그곳에 중학 강습소를 설치했다.
이어 그는 그 해 10월 1일에 중학 강습소를 동흥중학으로 승격시키고, 소학교를 동흥 중학 부속 소학교로 재편했다. 운영 경비는 주로 지역 인사들과 천도교의 기부금과 학생들의 학비로 충당되었다. 설립 초기 교원은 3명이고 학생은 4개 학급 113명이었다. 학생들은 주로 여러 지역의 천도교도 자녀들이었고, 연해주 출신들도 있었다.
대성중학은 용정의 유지였던 대성 유교 공교회 책임자였던 석화준(石華俊)과 청림교의 회주 임창세(任昌世) 등이 발기하고, 강훈(講訓)·남군필(南君弼)·장지량(張志良) 등의 지원 하에 각지의 창립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 강훈과 같은 인사들의 도움으로 연길 도윤(延吉道尹) 도빈(陶彬)의 비준과 지지를 얻어 용정 4구에 2층으로 된 벽돌 목조 교사를 짓고 1921년 1월 11일 개학식을 거행했다.
대성 중학은 초기에 강훈이 운영 이사 겸 교주를 맡았고, 공교회 인사인 임봉규가 교무 주임으로, 현기영(玄其永)·한장순·김소연·이정열 등이 교원으로 활동했다. 교과목은 동흥 중학과 비슷했으나 공교회에서 세운 학교였기에 기본 과목은 사서오경 『명심보감』 등이었다.
영신 중학은 회령 출신의 윤상철(尹相哲)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09년 10월, 윤상철이 추수하러 잠시 용정에 들렸다가 이곳에 학교가 없는 것을 보고 초가집 한 채를 사서 꾸린 광동서숙이 그 모태가 된 것이다. 그 후 1912년 9월, 윤상철이 용정 예수교 장로회중앙교회에서 광동 서숙을 넘겨받아 영신 학교로 개칭하고 학제를 초등과 4년, 고등과 2년으로 하여 새롭게 운영해 나갔다.
영신 학교가 영신 중학으로 변모한 것은 1921년 초 윤화수와 정사빈 등에 의해서이다. 1921년 5월 28일, 중앙 교회에서 영신 중학 개교식이 거행되었는데, 교장은 박례헌, 학감은 윤화수가 맡았으며, 교원으로는 백운기·윤화수·심광현·한성원·김종열·윤화락 등이 활동하였다. 학생은 중학반 4개와 소학반 3개로 나뉘어져 328명이 수학했다.
이듬해인 1923년 6월에 4년제의 영신 여자 중학이 개교하면서 영신 중학은 5년제로 하고, 영신 소학교는 6년제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다 1925년 4월에 영신 중학과 영신 소학교는 일본인 히다카 헤이고로[日高丙子郞]에게 넘어갔고, 이후 광명학원 중학부로 개편되고 말았다.
은진중학은 용정에서 활동 중이던 캐나다 장로교파 선교사 부트에 의해서 1920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은진중학의 개교식은 성경 서원에서 거행되었고, 교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배운다’는 의미로 ‘은진’이라 칭했다. 설립 초기에는 선교사 부트가 교장을 맡았고, 교감은 이태준, 고문은 김약연·이병하·박례헌 등이 맡아 활동했다. 학제는 5년제였고 자연 과학을 위주로 하여 성경·영어·한문 등을 배웠다.
명신 여자 중학은 1910년 예수교에서 세운 상정 여자 학교를 모태로 설립되었다. 먼저 1913년 6월 4일에 장로교파 교회의 선교사 바커의 부인 레베카 바커가 상정 여자 학교의 규모를 확대한 뒤 학생 158명과 교원 12명을 충원한 뒤 명신 여자 학교를 꾸렸다. 이후 1920년 6월 영국 선교사 게투루드 챠스(여)가 명신여자학교를 중학교로 승격시켰다. 그 후 21년간 명신 여자 중학은 21회에 거쳐 졸업생 255명을 육성했다.
마지막으로 광명 학원 산하의 학교들(고등 여학교와 사범부·어학원)은 나가사키 출신의 일본인 히다카 헤이고로에 의해 세워졌다. 히다카는 겉으로는 조선인의 교육에 힘쓰는 듯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선 총독부 및 일제 고급 관원들과 함께 간도 조선인들에 대한 식민 교육을 하려 한 것이었다. 그는 1922년 5월에 광명 여자 학교를 설립한 후 주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선인 여성들을 받아들여 초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1925년 4월에는 광명 여자 학교에서 고등과를 분리시켜 일본 외무성과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광명고등여자학교(중학교 교육)를 신설했다.
이외 광명 학원 사범과가 히다카에 의해 1923년 3월 1일에 설립되었고, 광명 어학교가 1922년 2월 19일에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들은 모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주입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즉 문화 침략의 도구가 되어 줄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상술된 학교들과는 차별된다.
중학교 과정으로 민족 학교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면서 그에 따른 조선인들의 지식과 항일 의식 또한 더 제고되어 나갔다. 용정을 중심으로 중학교들이 많이 조직되자 연변 각지와 러시아연해주 등지에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고 마르크스 사상을 접한 혁명가들과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이 용정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을 전하며 항일 구국과 투쟁을 주도해 나갔고, 한편으로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주장해 나가기도 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까지 각종 시위와 집회 형식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1933년 말 통계를 보면, 용정의 인구는 14,927명(3,170호)으로, 당시 용정에는 고등 사범과 1개소, 중학교 7개, 중학부 4개소, 소학교 11개, 유치원 4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학생 규모로 보면, 27개 교육 기관에 5,896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생들의 구성은 연변 각지와 남, 북만주 일대, 그리고 연해주와 조선, 일본에서 온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학생 규모는 용정 인구의 38.8%를 차지했고, 주택의 70~80%가 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되었다. 당시 용정은 명실공히 간도 조선인 사회의 근대적인 교육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제의 탄압과 통폐합으로 민족 교육은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동흥 중학·대성 중학·은진중학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던 항일 투쟁은 1931년 9·18 사변 이후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또한 일제는 연변 각지 학교들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시작했고, 동흥 중학·대성 중학·은진중학 등 용정의 여러 중학교들이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우선 1934~1938년 사이에 동흥 중학과 대성 중학이 민성 중학으로 강제 통합되었다. 이어 1936~1942년 사이에 은진중학이 여러 차례의 강제 개편 과정을 거쳐 간도성립 제3 국민고등학교로 개편되었고, 명신 여자 중학은 1941년 봄에 광명 고등 여자 학교와 합쳐져서 용정 여자 국민고등학교가 되었다. 이렇듯 모든 학교들이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민족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갔다.
용정의 중학교들이 민족 학교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이다. 1946년 9월에 용정의 6개 중학교, 즉 동흥 중학·대성 중학·영신 중학·은진중학·명신 여자 중학·광명 학원 산하 여자 중학이 통합되어 길림성용정 중학으로 개편되었고, 용정 지역 조선인 사회의 대표적인 민족 학교로 다시 자리 잡아갔다.
근대적인 민족의 요람, 서전 서숙의 설립자 이상설은 당시 많은 지식인-선각자들이 그랬듯이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 헤이그 특사 방문 이후 이상설은 간도와 연해주를 무대로 최재형(崔在亨)[1858~1920], 이위종(李瑋鍾)[1887~1917], 이범윤(李範允)[1856~1940] 등과 연계하며 극동에서의 항일 활동에도 전력을 다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 외곽에는 지금도 이상설의 유허비가 말없이 서있다.
1917년, 이상설은 연해주 땅에서 순국했다.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는 수이푼강(the Suifun River) 유역에 한 줌의 재로 뿌려졌다. 이를 아는 이들은 용정뿐만 아니라 우수리스크에 있는 유허비로도 발길을 옮긴다. 그는 간도가 자랑하는, 그리고 극동이 자랑하는 당대의 용기 있는 항일 지식인이자 교육자였다. 서전 서숙-명동 서숙-명동학교, 그리고 동흥 중학·대성 중학·영신 중학·은진중학·명신 여자 중학 등으로 이어지는 연변 민족 학교의 정신과 혼은 오늘까지도 연변 한인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제의 서슬 퍼런 칼날도 조선인 청년들의 교육을 향한 열정을 꺾지 못했다. 2009년 9월, 중국길림성 용정시는 130만 위안을 들여 서전 서숙에서 촉발된 근대 교육의 혼을 안고 있는 명동학교 복원 사업을 시작해 완공을 보았다.
옛터에 세워지는 복원된 명동학교는 4채의 단층 벽돌 건물로 이뤄졌던 1920년대 초의 명동학교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현재 한인[조선족]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학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명동학교는 1920년 4월 일제에 의해 불타버린 연해주 신한촌(新韓村)의 한민 학교나 이포(리포허, 지금의 연해주 이바노프카(Ivanovka) 일대) 지역의 명동학교와 동시대에 존재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만이 100년 전 간도와 극동의 한민족 사회에서 펼쳐졌던 민족 교육의 가치와 의의를 하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는 100여년 전 간도에서 전개되었던 근대적 민족 교육의 가치와 정취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느껴볼 때이다.
- 김춘선·김철수, 『중국조선족통사』상·중(연변인민출판사, 2009)
- 백민성, 『유서깊은 명동촌』(연변인민출판사, 2001)
-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박청산 책임편집), 『연변문사자료휘집』1(연변인민출판사, 2007)
-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박청산 책임편집), 『연변문사자료휘집』2(연변인민출판사, 2008)
- 김호웅, 「원 명동학교 복원된다」(『연변일보』, 2009.10.28.)
- 김호웅, 「윤동주의 명동학교 복원된다」(『연변일보』, 2009.11.2)
- 김호웅, 「윤동주 모교 명동학교 복원된다」(『흑룡강신문』, 2009.11.17)
- 김호웅, 「윤동주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나?」(『연변일보』, 2010.10)